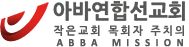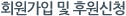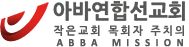고기반찬 소회
“야- 고기반찬이다!!”
어제 교회에서 주일 점심애찬을 나눌 때 아이들이 지른 환호인데 그 ‘고기반찬’의 정체는 ‘돼지뼈다귀 감자탕’입니다. 이제는 고기반찬이 ‘사무치는-’시대도 아니고 돼지 닭 또는 소고기나 생선 등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 가지 정도는 늘 주일 점심 뷔페 식탁에 오르는 것입니다만,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은 도시 시골 가릴 것 없이 60년대의 그것처럼 ‘찢어지게’ 가난하여 얼굴에 부황기가 오른 것도 아니면서도 늘 고기반찬을 선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한 시대정도를 겪어본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기반찬’이라고 하는 말에 애잔함의 향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고기반찬이 참으로 귀했던 시절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보리밥도 마음대로 실컷 먹을 수 없었던 시절에 어쩌다 밥상 위에 등장한 꽁치나 고등어 반토막을 바라보면서 젓가락을 잡은 손에 힘을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때만 하여도 대부분의 소시민들에게 소고기는 분명 명절 때나 생일날에, 그것도 ‘국’으로서만 맛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요즈음에 소고기도 한우와 수입우을 따져가며 부위별로 엄선된 고깃점을 화판 위에 척척 놓아서 구워 먹는 것을 보면 어릴 적 생일날 쉽지 않게 끊어 오신 소고기 몇 점을 넣으시고 ‘쇠고기무우국’을 끓여주시며 어쩐지 미안한 얼굴이셨던 젊은 과수댁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가슴이 짠하여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구레’를 아십니까? 소가죽 안쪽으로 붙어있는 피하속살을 말하는 것인데 ‘속살’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그 질긴 육질을 두고서는 ‘속가죽’이라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파와 고춧가루 등으로 어리하게 양념을 하여서 볶은 것입니다.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고기 단백질로서 어른들의 술추렴 판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구레 볶는 구수한 냄새에 킁킁거리며 포장마차 앞을 지나본 기억이 여러 가지로 떠오릅니다.
몇 년 전에 강릉으로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갔다가 그 옛날의 ‘수구레’가 있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몇 점을 접시에 담아 왔습니다마는 먹은 것은 딱 한 점이었습니다. 입안에서 미끈덩 거리면서 도망 다니는 수구레의 그 질김과 노린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양도 냄새도 맛도 옛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건만, 그저 오랜만에 옛 추억을 한 번 되새겨 보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은 저의 입맛이 변하였다라는 정답 때문이었습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의 사정은 그보다는 나았지만, 그 역시 실컷 먹어 볼 수 있는 날들은 거의 없었기에 가끔 신문지 포장이 열려지며 식구들 앞에 놓여졌던 순대와 거기에 들어있던 머리고기 몇 점을 고춧가루 뿌린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도 마냥 감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어쩌다가 길을 잘 못 들은 것처럼 우리집 밥상 중앙으로 올라온 ‘닭도리탕’의 뚜껑이 짠-하고 열려질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는 ‘토요명화’의 시작을 알리던 시그널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 상기한 교회 아이들의 마음도 그랬을까요.
60년대 후반 즈음, 누구라고 함자를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저의 주변 어르신과 TV의 흑백영상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무슨 요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진행을 맡은 잘생긴 아나운서의 “오늘은 묵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라는 말에 잔뜩 기대를 하고 아나운서와 요리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김치냉장고 같은 것은 아예 그 이름조차도 없었고 김치항아리를 묻을 곳은 찾을 수도, 있지도 않았던 도시의 소시민들에게는 겨울을 지난 ‘묵은 김치’가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를 이어 받은 요리사가 -
“예, 오늘의 준비물은, 먼저 묵은 김치 한포기를 준비하시고요... 다음은 돼지고기를 약 300g 정도를 준비하신 다음에... ”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처럼 화면을 주의 하여 보시던 어르신께서 내뱉듯 한마디를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미친놈들, 고기가 들어가서 맛없는 게 어디 있나.”
허허, 그 한 말씀이 당시를 말해주었던 것이지요. 저 역시 맞아요 맞아 라고 속으로 맞장구를 쳤는데 돌아보면, 지난날들 동안 고기는 언제나 채소보다 비싸고 귀한 것이었는데 아무리 웰빙을 외치며 야채의 유익을 조목조목 나열하여도 설명하여도 늘어나는 것은 갈비집이지 채식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몸이 ‘힘’을 얻기 위한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육식이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몸에 ‘약’이 되는 것은 채식이 분명하므로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면 육식보다는 채식의 비율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이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을 지나 본 사람도 아닌 작금의 아이들이 여전히 채소보다는 고기를 원하고 선호하는 것은 아마도 언제까지나 계속되어갈 현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근본이 ‘약’보다는 ‘힘’의 논리로서만 이 세상에서의 강자로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무의식중에 인정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비약된 것일까요?
제가 겪어 온 ‘고기반찬’을 돌아보면서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고기반찬을 선호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고기’를 먹고 그 힘으로 정상을 향하여 줄달음을 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산과 들에 흔하게 심어 놓으신 ‘약초’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아픔과 피곤함으로 뒤 처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산골어부 김홍우 목사 09-3-22
http://cafe.naver.com/khwm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