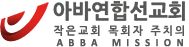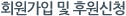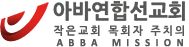한 때는 시인(詩人)이였었네
소싯적 한 때는- 동서양의 시집들을 헌책방에서 사 모으며 즐겨 애송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시를 펼쳐들고 읽어보기가 쉽지 않네요. 아니 자꾸만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애써 시간과 돈들이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시(詩) 시문(詩文) 시비(詩碑), 그리고 책장에 꽂혀있는 시집(詩集)등을 언제라도 보고 읽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옆에 있고 곁에 있어서 공짜로 쉽게 읽혀지는 시(詩)들보다는 상당한 가격을 주고라도 사서 읽는 각종 잡지, 산문, 칼럼, 세평 등에 눈길이 더욱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자꾸만 메말라 가는 것이 아닌가... 마음속의 서정 보다는 손에 닿는 실리로 치닫게 된 것은 또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다수의 시(詩)들이 서정시(抒情詩)의 형태로 이상향의 노래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꼭 그리고 전부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출판되어져 있는 대개의 시집들을 손에 들고 펴보면-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아름다움과 그것에 대한 찬양의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서사시(敍事詩), 극시(劇詩), 풍자시(諷刺詩).. 그리고는 절규, 개탄, 탄식, 고발 등의 내용을 외치고 부르짖으며 우는 마음으로 지어낸 시(詩)들도 많이 있지만, 역시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시(詩)들의 형태는- 아직까지는 서정시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고단한 일상의 모습을 떠나서 그저 다만 마음속에라도 그려보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향한 욕구와 갈망의 일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류의 사람들은 ‘당장의 현재’를 떠나 ‘꿈꾸는 이상’을 노래하는 모양들에 대하여서 ‘한가하다-’라고 마뜩치 않은 눈으로 바라보며 비아냥대기도 하지요.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시(詩)라니...” 하는 눈총이 그것입니다. 물론, 시(詩)가 무언지도 모르고 또 그러기에 시(詩)의 역할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시(詩)의 필요성도 모르고 간과하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무지하고 둔한 모양들이지만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또 풍파를 일으키고 원수 짓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허허.
나만 그런가...? 아니면 우리 대부분이...? 현대의 분주한 일정 속에서 시(詩)를 찾아 읽고 시집(詩集)을 골라 들면서 얇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값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쯧- 하면서 다 그런거지 뭐... 하다가도 뭐가 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는 안 돼는 것이잖아... 하는 생각 또한 들곤 하는 것을 보면 환갑의 나이가 되어서도 이렇듯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한심스러워서 또한 쯧-쯧- 혀를 차게 됩니다.
소싯적, 처음으로 아름다운 느낌을 가지고 수줍은 듯 내 곁에 다가앉은 시(詩)는 김소월의 ‘산유화’였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어쩐지 그 시가 좋아서 나도 모르게 입에 붙게 되어 어디서든지 중얼중얼하곤 하였지요. 그리고는 윤동주의 ‘서시’가 어쩐지 폼(!)이 나는 것 같아서 또 중얼중얼... 그리고는 이번에는 ‘나탈리 우드’의 예쁜 얼굴을 생각하면서 ‘초원의 빛’을... 다시 또 무언가 신비하고 아련한 그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포어의 ‘애너벨리’를 원문으로 중얼중얼... 그리고 바이런... 콕도... 의 시(詩)들을 읊조리다가 고향을 떠나고 부터는 “비가 온다 오누나... 가도 가도 왕십리에 비가 오네...” 하는 김소월의 ‘왕십리’- 내 고향의 시(詩)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넌 시(詩)를 잘 쓰는 구나- 이건 참 잘 지은 아름다운 시(詩)다.”
봄.
봄이 온다네
봄은
봄바람을 타고
저 산등성이를
훨훨 날아 넘어 온다네...
중학생 시절- 지금까지도 그 첫 문단 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 ‘봄’이라는 시(詩)를 교내 백일장 대회에 써냈을 때- 국어 선생님은 일부러 나를 불러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고... 급기야는 장원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갑자기 시인(時人)이 된(!) 저는 이후 우쭐해진 어린 마음에 벌써 세계적인 시인이 되어 마구잡이 졸작들을 남발하였지요. (지금은 그것들이나마 다시 한 번 간절히 보고 싶은데... 다 어디로 간 것이냐...)
이제는 그때 추억의 장면들 속에서조차도 굳게 다문 조개 입처럼 어지간해서는 잘 열려지지 않는 먼지 덮인 시집들... 이제... 지금쯤은 어떻게든 후-후- 불면서 툭-툭- 먼지를 털어내고는 그 정들었었던 시(詩) 구절들을 다시 찾아 읽어 보고 읊어 볼 때가... 아니 꼭 그렇게 해보아야만 하여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지...
휘-잉? 곱게 핀 구절초를 단숨에 깔아 눕히는 잔인한 가을저녁 바람 뭉텅이가 한 철의 승기를 잡은 기세 좋은 모양으로 온 몸을 후드득- 스쳐 때리며 지나갑니다.
“알았어, 정신차릴께...”
산골어부 김홍우 목사 20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