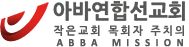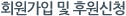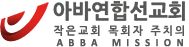망령함멈 소회
지금은 무슨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서울 왕십리 꽃재동산... 그곳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 무서운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그 집 근처 골목이나 길가에서 오그르르 모여 딱지치기라든가 구슬치기 같은 것을 할 때면 갑자기 그 집 나무 빗장 대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그 할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지게 작대기 같은 것을 들고 나와 휙-휙- 위험스레 휘두르며 “이놈들-!! 빨랑 가지 못하냐-!!” 하고 소리를 질렀고 또 어떤 때는 분명히 여섯 바늘 이상 꿰맨 것이 선명히 기억나는 공포의 박바가지에 철렁-철렁-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와서는 우리들에게 좌-악-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길바닥에 있던 딱지며 구슬을 압수(!)하여 가지고는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물벼락을 맞고 우르르 안전거리 밖으로 도망가서는 그 할머니를 향하여 원망의 눈빛을 가득 보내며 구시렁거릴 때 함께 물기를 닦던 친구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망령할멈이야 망령할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들이 집을 나갔대-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저런대-”
누구든 어른을 향하여서 하는 말로서는 아이들의 입에 담겨져서는 안 될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할머니를 향한 우리들의 분노는 대단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울면서 자기 엄마에게 호소를 하여 엄마가 가서 사정하여 그 압수된 물품들을 되받아 오기도 하였고, 여자 아이들 또한 그 근처에서 고무줄놀이를 하다가 그렇듯 험한 꼴을 당하고는 울면서 집에 들어가곤 하였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도 그 할머니와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가끔 있었고 그래서 많이 들 싫어하였습니다.
“엄마, 그 할머니 망령 나서 그런대-”
“쯧- 누가 그러던? 그런 소리 하지마라, 아들이 죽어서 그런다...”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그 할머니가 일찍 상부(喪夫)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는 것 아들이 무슨 사고로 죽었고 딸 또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집안에 환란이 많았다는 것 정도로서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는데 주위 어른들도 쯧-쯧- 하면서 말하기를 꺼려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이겠지요. 당시 어른들에게는 일면 ‘불쌍한 할머니’로 동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나이 어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상기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망령할멈’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 내며 추억하여 보는 이유는- 그때 그 할머니의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와 비슷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할머니’였지만, 당시 동네 어른들에게는 ‘아주머니’였던 것이지요. 그때의 여자 어르신들의 머리 스타일은 오직 두 가지로만 나누어져서 머리카락을 모두 대나무 참 빗으로 끙-끙- 그러나 곱게 뒤로 잡아 당겨서 쪽을 짓고 비녀를 꽂은 것이 아니면 우리 엄마처럼 바글바글 꼬실꼬실 파머를 한 머리였지요.
반백의 쪽진 머리에 늘 무명 치마저고리 차림이었기에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우리들에게는 ‘할머니’였지만, 지금 가만히 그때 들었던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보면 50대 후반 내지는- 아무리 멀게 보아도 60대 초반 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엊그제 환갑을 넘겼으니 그때 그 할머니 즈음이 된 것 같아서 후- 하는 긴 한숨을 토해내게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망령(妄靈)’을 찾아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말로 하면 치매(癡?)라고도 할 것이지만 조금 다른 것은 치매 환자는 언어동작이 재빠르지 못하고 느리고 어눌하여 보호자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그때 그 할머니는 ‘물 가득 채운 큰 바가지를 들고 한 달음에 달려 나올 만큼-’ 기운이 넘치셨기 때문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망령할멈’이 아니라, 큰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 상한’ 할머니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공포의 작대기’나 ‘바가지 물 폭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나잇적 아이들에게는 좀 심하셨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할머니 나이 즈음을 지내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어떤 아이에게 ‘망령할배’의 인상을 준적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허허. 물론 이날 이때까지 잘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바가지 물을 끼얹은 적은 없지만- 얘 어른 할 것 없이 지금 ‘나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속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되었기에 ‘여하튼-’ 남들 보다는 조금 더 꾹꾹 눌러 참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자칫 ‘망령할배’로 나아가는 모양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제 내가 그 할머니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때 그 할머니의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가지고 새로이 근접해 보게도 됩니다. 과연 ‘세월이 약’인 것일까요.
깨진 유리병의 날카로운 조각들을 쪼롬하니 담장 위에 세워 놓아 외부의 침입에 경고하였던 것을 것이 기억나십니까? 바가지 물벼락에 흠뻑 젖은 머리에 눈을 똥그랗게 뜨고 콩당-콩당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친구들과 함께 비 맞은 닭들처럼 몰려 서있었던 그 담장- 다시 한 번 더 그때처럼 그 담장 아래 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이유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환갑노인’의 아직도 철없는 마음이 반세기 전 속 내 친구들과 함께하였던 그 ‘아이들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망령할멈- 할머니 그때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그리워지는 애정의 이름들이 되었어요.
산골어부 김홍우 목사 20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