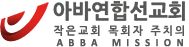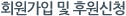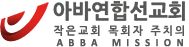자꾸만 어릴 적 생각이...
“그 참... 이상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나이 쯤 되니까 자꾸만 어릴 적 생각이 나고 그때 모습들이 떠올라요. 친구들이랑 개울가에 나갔던 일... 아버지랑 산에 나무하러 갔던 일... 엄마가 해주던 호박부침개... 허허 왜 그런지 몰라. 이젠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니까 그런가...”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자꾸만 옛날 일들이 떠오른다니까-”
우리 마을 두 분 어르신이 나누시는 대화의 한 장면을 옆에서 듣고 옮긴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여든에 다다르시는 중이시니 이제 예순이 되는 저에게는 아주 큰 형님들이나 삼촌들 같고 또 아버지 같기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중에 허허롭게 빙긋이 웃으시는 얼굴들을 바라보니 소싯적의 소회와 지나온 세월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때마다 속 단상들의 감출 수 없는 배어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생각이라... 지난날들의 추억이라고 할 것이지요. 그런데 두 분 공히 ‘엄마’ ‘아버지’ ‘뛰어 놀던...’ 등의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보니 장년시절은 물론 아니고 청년도 되기 전- 아주 소싯적 어린 풍경들을 떠올리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정점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청춘이 꽃피워지던 시절을 말들 하는데 왜 ‘코흘리개’ 적 장면들을 떠 올리시는 것일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 남의 말을 할 것도 없이 이제 나이 예순을 석 달 앞두고 막 내딛을 한 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저 역시 늘 옛 것들이 생각나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시절들의 장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형식으로 써 놓은 일기 글들 중에도 그 당시 어린 시절들의 단상과 소회가 많고 만일 돌아가 볼 수만 있다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때로만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봄에도 일부러 작정을 하고 가족들을 대동하고 나서서 서울 변두리 50년 전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짓기도 하였는데... 사실 뭔가 모를 아련함 속에서 나오는 긴 한숨을 더 많이 내쉬었지요...
작은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그 곳의 골목길들마저 너무나도 반갑고 정겹고... 그때의 냄새를 진하게 풍겨주는 낡고 빛바랜 흑백사진 한 장이 이제는 보물처럼 소중한 것을 보니...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래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미워서 눈을 흘기며 싸우기도 여러 번 하였던 친구의 떠오르는 얼굴도 이제는 사랑스럽고 엄마 몰래 꺼낸 오십 원 지폐를 들고 나가서 친구들과 흥청망청(!) 쓰다가 발각이 되어 기절할 만큼 아프게 내 등짝에 내려졌던 엄마의 회초리 바람 가르는 소리도 이제는 차라리 그립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가장 어른 된 나이가 되어 이제는 ‘어르신’으로 대접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름진 얼굴이 가리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 그 속에서는 그렇듯 ‘뽀얀 어릴 적의 속살’이 여전히 깡충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한 가지로만은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연유로 되어 지는 눈가의 촉촉함을 만들어 내면서 내가 살아온 날들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자문에 대한 정답으로의 작은 쪽문을 살며시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노인 된 이들이 떠 올리는 어릴 적 영상이라... 혹 지난 소싯적 날들 속의 순진무구함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남은 날들의 소중함과 그 향방을 일깨워주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모두 잃어버리고 또 쓸모없는 것처럼 내팽개쳐진 그 옛날의 나의 모습들을 떠올려 주는 것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몸부림을 쳤으며 그 결과로 남겨진 것은 무엇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전래고담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늙은이의 지혜’를 후대에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골어부 김홍우 목사 2014-12-5